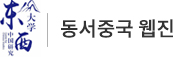문선 그리고 두보시 영역본에 대한 짧은 생각

10년도 넘은 시절,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1년 정도 소일한 적이 있다. 이때 시간을 보내는 방편으로 이런저런 수업을 들었다. 그 수업 가운데 David R. Knechtges란 선생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문학사 수업이 있었다. 수업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였던 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 대학의 중국문학사 수업은 3학기 시리즈, Knechtges 선생은 선진, 양한, 위진남북조를 강의하였다. 이어지는 두 시기는 또 다른 문학 전공 선생이 맡는 시스템이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고리타분하다고 할 정도. 예를 들어 초사를 공부할 때는 Knechtges 선생이 이소 같은 대표적 편장을 골라 학생들과 같이 읽는다. 한부를 공부할 때도 사마상여, 양웅의 대표작을 골라 꼼꼼하게 읽는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읽는다. 물론 시가의 특성상 원문이 병기된 경우가 많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며 왜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곤 했다. Knechtges 선생, 수업 준비 참 열심히 한다. 언제 저런 걸 다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해보니, 그가 바로 문선을 번역하여 출판해내었더라.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에서, Vol. 1, 1983, Vol. 2, 1987, Vol. 3, 1996, 이렇게. 자기가 번역하고 그걸 수업시간에 차근차근 학생하고 읽어가는 맛도 있겠구나, 부러웠다. 이런 수업에 3,4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오는 게 신기했다. 중국인 유학생 파워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래도 대단해 보였다. 아무튼 이 문선 번역이 완역은 아닌 거 같기는 하다. 이 Vol. 3까지의 번역이 문선 전체를 완역한 것 같지는 않다. 전체 60권 가운데 제19권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19권이 부의 마지막이자 시의 시작인데 부의 마지막 작품인 조자건의 낙신부까지 번역하였다. 한국에서는 2009년에 5명의 역자들이 완역해낸다. Knechtges의 문선 번역본은 2014년에 De Gruyter 출판사에서 전자책으로 공개되었다. 번역의 결과를 묻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좋아 보인다.
이 문학사 수업 시리즈의 두 번째 파트는 원, 명, 청. John Christopher Hamm 선생이 맡았다. 수업 방식은 Knechtges 선생과 대동소이하였으나 좀 더 다이내믹한 느낌. 아무래도 더 젊어서일까! Hamm 선생이 부교재로 사용한 것은 Stephen Owen이 펴낸 An Anthology of Chinese Literature: Beginnings to 1911이라는 책이었다. 중국문학의 시원부터 신해혁명 전야까지 시대별로 흐름을 개관하고 그 시대의 대표적 작품을 선별하고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을 부교재 삼아, 학생들에게 피디에프 본으로 배포하여 수업에 다룰 해당 작품을 읽어오게 하고 수업시간에 중요 대목을 같이 읽고 토론하곤 했다. 아무튼 1,264쪽이나 되는 이 책의 분량이 놀라웠다. 대학시절 돌아가신 홍인표 선생님한테 중국문학개론 수업 들을 때 듣도 보도 못한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억지로 외워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나 역시 또 강단에 서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중국문학의 수많은 작가와 작품을, 대체 저걸 내가 왜 배우지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하곤 했었다. 한데 Owen이란 사람 쓴 이 책을 만난 거다. 저 Owen은 그래도 중국문학 작품을 나보다는 많이 읽어보았을 거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을 할 거 같지는 않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2019년 벽두, 이 Owen이란 사람이 두보시를 완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5년 12월에 출판했다고 한다. 아마존에서 찾아보니 책값이 210달러나 되기에 이리저리 뒤져보았다. 이 책을 출판한 De Gruyter라는 출판사 홈피에 가보니 이 책을 인쇄본으로 사려면 사고 아니면 그냥 전자책으로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료로 다운받으라 해서 전자책을 다운받았다. 처음엔 공짜로 책을 구한 게 너무 좋았다. 뭐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읽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찜찜했다. Owen이란 사람이 진짜로 저거 혼자 자기 힘으로 다 했을까. 제자들한테 시켰을지도 몰라. 아니면 여럿이 작업하고 자기가 그냥 묶어냈을 거야. 저런 책을 공짜로 푸는 건 또 뭐냐! Owen의 Acknowledgements를 읽어보았다. 멜론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아 2007년에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공동번역 작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과감하게 도전하여 번역해내면 다른 사람이 그걸 읽어주고 오역, 쉬 읽히지 않는 문장, 낯선 표현을 지적해주면 그건 그 번역자를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선물을 주는 거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식의 말이었다. 이 공동번역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 우리가 공동번역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혼자서 하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둘 혹은 셋이 나눠서 각각 번역하고자 함인가. 그렇다면 번역하는 시간을 한 사람이 두 배 세 배 투입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공동번역이 상대방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텍스트 읽기를 둘이 동시에 같이 하면서 서로 번역한 것을 바꿔가면서 읽어가고 고쳐가는 것이라면 둘이나 셋이 한다고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혼자서 번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과 품이 들 것이다. 아니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면 의견조율하고 토론하느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시간과 품이 외려 더 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분담하여 번역하고 나중에 합쳐서 출판하는 공동번역이라면 Owen이 못 믿겠다고 한 말이 그렇게 야박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Owen은 일단 혼자서 책임지고 번역하고 그런 다음 그 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갖춘 동료들에게 읽혀서 혼자서 번역하느라 못 본 많은 실수를 잡아내고 새로운 해석을 수용하고 그러는 게 낫겠다고 말한 것이리라. 그렇다면 결국 이 과정은 제대로 된 공동번역 작업이 바랐던 효과인 것이기도 하다.
근데 나는 위에서 언급한 Owen과는 다른 각도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내건 (문학)번역을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는 영원히 번역을 통해서만이 외국문학을 문학으로 접하게 된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한국인은 한국어로 구현된 외국문학작품을 읽는 것이지 외국어로 구현된 외국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 작품이든 우리는 결국 한국어를 읽으며 외국의 풍치와 맛을 상상한다. 번역자는 한국어로 그 맛을 드러낼 것이며, 그 맛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 문체. 번역자가 선호하는 단어, 어떤 외국어 단어를 제시할 때 동일한 외국어 구사자들 사이에서도 처음 떠올리는 한국어 단어(매칭 단어)가 갈릴 거다. 한 문장의 길이와 호흡, 어순에 대한 특이한 취향, 건조와 만연, 강함과 부드러움, 되묻기, 반어, 의문 등등의 표현에 대한 선호도에 의하여 드러나는 문체. 번역자는 결국 이 문체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럼 공동 번역의 경우, 이 문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나는 아직도 문학 작품이란 걸 감수성과 개성과 하얀 밤을 지새우는 고민의 소산으로 보고 그래서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왕에 Owen을 칭송하였으니 한마디 더 하자면, 그는 두보시를 번역하면서도 주석에 인색하다. 대신 원문에 해당하는 번역문 자체로 승부한다. 나는 그게 좋다. 읽는 맛을 독자에게 돌려주고 싶다. 나는 혹시 번역문 자체로 승부하기 겁나서 부가적 설명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거처야 할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흑역사를 통하여 절제를 배우고 압축하는 걸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다. 가야 할 길은 멀고먼데 해는 서천에 걸렸다. 지난 시절,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앞세워 뭔가 다른 일에 매달렸을 때, 그땐 사실 중문과 공부쟁이들이 국문과나 영문과 친구들은 뭔가 그럴듯한 이론공부로 무장했다고 지레짐작하고 자발적 열등감을 조금은 갖고 있기도 했으니. 돌고 돌아 다시 작품으로 왔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줄, 한 줄 제대로 읽고 싶은데 마음만 조급하다. 그래도 제대로 작품을 읽고 그 결과를 한 땀 한 땀 내 모국어로 직조해내고 싶다. 지금은 삼언을 번역하고 있다. 아니 번역했다. 한데 그게 돈이 안 되는 책이고 내 이름값이 그걸 벌충할만한 깜냥이 아니다 보니 민음사란 출판사에 넘겼는데도 부지하세월이다. 언젠가는 내주겠지 한다. 그런 다음엔, 삼국지를 해볼까, 수호전을 해볼까, 아니면 탕현조나 이어 전집에 도전해볼까 고민 중이다. 어느 걸 하던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선사할 수 있는 내 바탕을 만들어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이 글을 접는다.